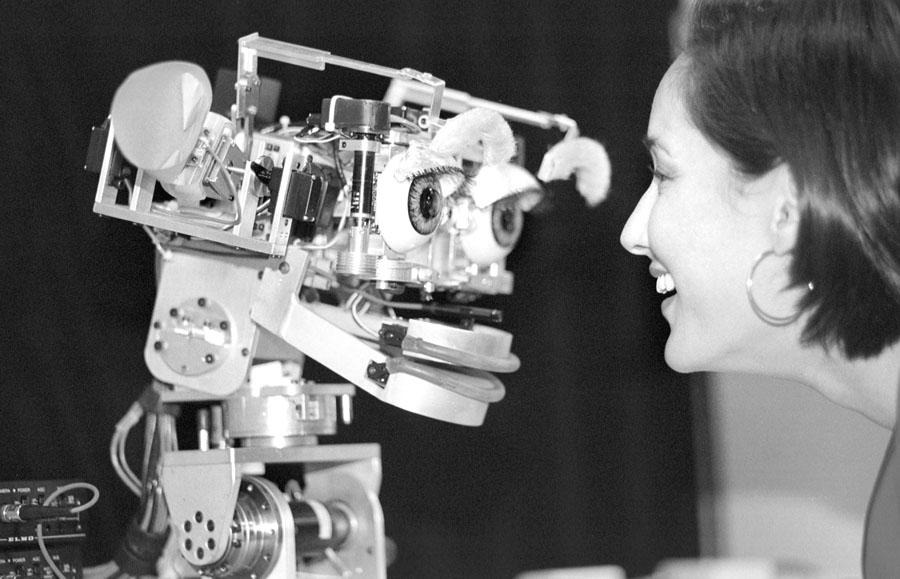라디오를 처음 발명하던 시절, 무선 신호를 받아 듣는 일은 오늘날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무선 통신은 주로 모스 부호를 사용했습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송신기는 낮은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신호는 바로 검출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되었죠. 단순한 수신기로도 모스 부호의 점과 선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주파의 반송파를 이용한 전송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kHz나 수백 MHz 대역의 RF 신호를 보내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높은 주파수 신호를 단순한 검파기(복조)로는 바로 소리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발명가 레지널드 페센든은 1905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개의 고주파 신호를 혼합하여 차이 주파수를 생성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페센든은 약간 다른 주파수의 두 신호를 섞어 비트 주파수(beat frequency)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주파 신호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이 되었는데, 이 기술을 "헤테로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헤테로다인(Heterodyne)은 서로 다른 두 주파수를 섞어 새로운 주파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 헤테로(hetero): "다른", 다인(dine): "진동"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서로 다른 진동을 섞는다"
고주파 신호의 또 다른 문제는 신호 증폭이었습니다. 1910년대 라디오 신호의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신호를 증폭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에는 TRF(동조 증폭기) 수신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바꿀 때마다 여러 증폭 단계의 조율을 모두 변경해야 했고, 고주파에서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전자공학자 에드윈 암스트롱이 이 한계의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는 1918년경 신호를 직접 증폭하는 대신 더 낮은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후 증폭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 1.5MHz 신호를 약 75kHz로 낮추어서 증폭하면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주파 신호를 중간주파수(IF)로 변환한 후 증폭하는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가 탄생합니다. 이 혁신적인 방법은 곧 상업용 라디오에도 채택되어 표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라디오 수신기는 이 슈퍼헤테로다인 원리를 사용합니다.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핵심은 "혼합을 통한 변환"입니다. 이 수신기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 수신단계
1. 안테나가 외부의 전파 신호를 받아들인다.
2. 입력 신호는 RF필터(튜닝 회로)를 거친다. 이 필터는 듣고자 하는 신호만 통과시키고 잡음을 걸러낸다.
주파수 변환 단계
3. 로컬 오실레이터(LO, 국부 발진기)가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생성한다. 이 오실레이터는 사용자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함께 조정된다. 보통 안테나 신호보다 약간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만든다.
혼합 단계
4. 안테나 신호와 오실레이터 신호는 믹서(mixer)에서 서로 곱해진다. 이 과정에서 "헤테로다인" 효과가 발생한다. 혼합기 출력에는 두 주파수의 합과 차에 해당하는 성분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차이가 되는 주파수 신호를 중간주파수(IF)로 사용한다.
증폭 및 검파 단계
5. 중간주파수 필터(IF 필터)가 차 주파수만 통과시킨다.
6. IF 증폭기를 통해 중간주파수 신호를 충분히 증폭한다.
7. 검파기(복조기)에서 원래의 정보 신호를 추출한다.
8. 마지막으로 오디오 증폭기를 거쳐 스피커로 출력된다.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점은 다양한 주파수의 방송 신호를 하나의 동일한 중간주파수로 변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라디오 주파수를 바꿀 때는 RF 튜닝 회로와 로컬 오실레이터만 조정됩니다. 나머지 중간주파수 이후 회로는 항상 같은 주파수로 작동하므로 설계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다음 글에선 중간주파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